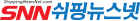메르스 증상은 고열•호흡곤란 등으로 눈으로 봐서는 폐렴과 구별이 어렵고 사람 사이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의 발병 규모는 메르스의 발생지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 이후 메르스 감염 규모는 6월 15일 현재 격리자 4,000여 명, 확진자 150명, 사망자 16명에 이른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되는 질병의 특성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도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다. 세월호 참사 때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든 잠수사들과 같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매달리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것일 뿐이지 다른 경로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방역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WHO 합동평가단은 지난 13일 "(한국내)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는 없으나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기 중 감염을 경고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확진 환자 가운데는 병원 밖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초기에 대처를 잘 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질병이었다.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강하다는 사스가 유행했던 10년 전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국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나, 이번 메르스에 대한 대처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 중에서 확산 초기 단계에 감염자가 거쳐간 동선이나 병원 등을 불문에 부친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오히려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를 틈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나를 언제 덮칠지 몰라서, 그리고 누가 나에게 병을 옮길지 몰라서이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전염병 그 자체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각종 보도에 의하면, 메르스 자체는 면역력이 갖추어진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과 같이 지나가는 질병이라 한다. 이는 우리의 헌신적인 의료진이 적극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떨쳐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지속될 것 같다.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인해 생겨난 공포심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