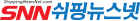문제는 작금의 물류대란 사태이다. 우리 법원의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과 인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이므로, 그 법적 영향력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된다. 그런데, 세계 각지를 운항하는 해운회사의 특성상, 한진해운의 중요한 자산인 선박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기항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채권자들은 외국에 기항하는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경매하여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한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 선박은 압류가 기다리고 있는 외국의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선사의 회생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였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이 개시된 뒤 지난 31일 한진해운 선박 22척이 비정상운항을 시작하였고, 일주일만에 87척(미기항 84척, 가압류 3척)으로 늘어났다.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채권자들을 탓할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각국의 법에서 허용하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할 뿐이다. 사태 악화의 1차적 책임은 우리 나라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압류 금지 조치(보호명령: Stay order)를 해외 각국에 신청하여 한진해운의 자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던 한진해운에게 있다. 한진해운처럼 전세계를 영업범위로 하는 회사가 회생신청을 할 것이었으면, 회생신청 전에 미리 세계 각국에 압류 금지 조치 신청을 진행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진해운은 그와 같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커다란 실수가 아닐 수 없다. 화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 이상 앞으로 어떤 화주가 한진해운에 화물을 위탁할지 의문이다.
결국 살펴보건대, 한진해운의 회생 신청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않으려고 하는 한진해운과 채권단의 극한으로 치달은 치킨게임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채권단의 지원 불가 결정이 나오자마자 추가 협상 없이 바로 회생신청을 한 점, 그리고 그 회생신청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예상했어야 할 리스크를 간과한 점 등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치킨게임을 벌이며 마주보고 달리던 두 차량은 서로 충돌하여 둘 다 자멸하는 최악의 결과를 택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가 '한 때 잠시 해운강국이었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운산업의 합리적 발전 방안에 관한 각계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