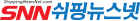사실 우리나라는 해운이나 항만산업에는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약 2,000만TEU의 컨테이너물동량 중 48% 이상이 내국 수출입화물이다. 전국의 주요 항만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화물 중 수출입화물이 약 1,000만TEU 이상이 된다는 것은 유럽의 최대 환적항이라 할 수 있는 로테르담 항만의 전체 물동량과 맞먹는 것이다. 이 정도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포함한 어떠한 정기선사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정기선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을 가진 항만은 정기선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항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적선사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간접적 시장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해운항만정책은 환적화물 유치정책에 매몰돼 있어서, 국내 항간에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항만이 가진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외국선사에 끌려다니면서 국적선사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P3 문제가 대두될 때에도 결국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문제삼아 해결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적선사를 거대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을 통제해야 함에도 환적화물이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또 지난 연말 한진해운사태 때도 부산항의 환적화물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얼라이언스 등 해외선사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는 등 갈팡질팡한 정책을 남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오류는 우리 해운과 항만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막강한 국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최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다. 이로 인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항만하역업 등에서도 외국 선사에 협상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에서 수익률 약화, 항만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항만사용료의 지속적 인하로 인한 국고 낭비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0년전 모 방송사의 특집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한 적 있는데, 당시 홍콩 허치슨의 CEO가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우리에게 물동량 처리에 의한 항만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수익이 기준이다.”
그동안 갈팡질팡한 해운물류정책에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 엄기두 신임 해운물류국장의 인터뷰는 “아! 이제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2자 물류국가로서 장점이 크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모든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발상전환과 정책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해운산업은 그간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진해운 사태가 큰 자산이 돼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물론 항만의 경우도 부산항이 장점을 살려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광양항이나 인천항도 나름의 장점을 살려서 수익성있는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임 해운물류국장의 취임이 우리 해운항만산업의 일대 전환점이 돼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해수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