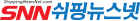선진 한국 해운산업, 더 큰 글로벌 마인드로 해외진출에 진력해야
바다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금융 역할도 중요
“국제성은 동시에 경쟁을 의미한다”

“바다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첫 멘트로 대화를 시작하는 김인현 교수. 국내에서 손꼽히는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는 해운산업 지킴이 역할에 분주하기만 하다. 남다른 해운 사랑에 코로나19 발발이후 비대면 활동이 더욱 왕성하다. 그러기에 김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김 교수는 “지난 1960년부터 시작된 선원 송출도 해외로 진출해 달성한 위대한 업적이다”며 “한국에 승선할 선박이 없자 선배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선원의 송출 길을 개척했다”고 힘주어 말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도 있으며, 2~3년간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라스팔마스, 사모아 등에서 원양어선 기지를 개척한 선배들의 이야기는 눈물겹다”고 덧붙인다.
“1980년대 세계 일주 정기선 항로를 개척한 조양상선과 한진해운 선배들의 개척정신도 잊을 수 없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헌신,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가득 찼던 바다의 선배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김 교수는 언급.
세계 1위를 달성한 지 이미 20년이 된 한국 조선업은 해양플랜트사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해운산업이 5~6위권을 유지한 지도 오래됐지만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 등의 어려움도 겪었다.
김 교수는 “국제성은 동시에 경쟁을 의미한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 산업은 낙오하게 되며,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보호, 다른 산업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 바다 관련 산업은 국내에서는 외국기업들에게 적게 내주면서 해외에서는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운산업보다 더 큰 규모의 국제성을 가지는 것은 종합물류업이다. 해상, 항공, 육상운송 그리고 현지의 물류센터까지 포함한다. 국내 2자 물류회사는 주로 모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 현지 시장에서 성장해 왔다. 하지만 DHL과 같은 글로벌 종합물류회사에 비하면 1/10 규모다.
김 교수는 “국내 2자 물류와 3자 물류 회사의 해외 동반 진출과 현지에서의 성장을 더욱 장려하자”고 말한다. 늘어난 현지 물류 중 해상운송 구간은 우리 정기 선사들이 담당하도록 하면 2자 물류 회사와 정기선사의 매출이 동시에 증대해 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한진해운이 스페인의 알제시라스항을 모항으로 이태리와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를 개설해 3국 간 운송을 했다. 우리 정기 선사들은 선배들이 개척했던 이 항로를 복원해 대한민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조선산업은 환경규제에 부응하는 선박추진연료의 교체,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무인선박의 건조라는 큰 시장을 만났다.
김 교수는 “부울경 해사크러스트의 완성으로 선주사를 육성해 그 밑에 100척만 둬도 연간 2조 원의 용선료 매출을 올릴 수 있다. 20명의 우리 선원을 태우면 2000명의 고용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바다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해운산업에 한정된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영역을 확대하면, 바다 관련 산업의 든든한 금융 조력자를 두게 되는 것이다. 선박금융, 조선, 해운과 물류 분야가 대한민국 원팀이 돼 해외로 진출한 사례로는 카타르 LNG선 100척 운항 위탁 수주사업이 있다. 항만하역, 예선, 선박급유, 조선기자재 등 분야의 외국 진출도 장려되고 시도돼야 한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인 해상보험, 해상법, 바다 관련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의 해외진출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부언.
김 교수는 특히 “좁은 국내에서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해외로 더 나갈 때 매출은 확대되고 고용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바다 관련 산업이 해외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다 산업의 국제성이 갖는 동일성 덕분”이라며 해운, 조선, 해상법은 국제 공용화되고 표준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인력이 양성되면 바다 산업의 해외 진출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김 교수는 “해외시장의 진출에는 위험이 따른다”며 “그 위험을 회피하려면 법무와 보험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고 밝히면서 부산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