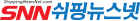-필수재 보세창고 예외 허용, 물물교환 무역 발표
-외환 위기 정부, 필수재 우선 반입 강행
KOTRA(양곤무역관 KayThwe Oo)는 25일 '교역 여건 악화 속 발표된 미얀마 정부의 통상지침' 리포트를 발표했다. 미얀마의 교역 여건은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원자재 공급난, 자국 내 물류의 경색, 상품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들의 조업도 감소 등이 겹치며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수입 역시 내수시장의 위축과 환율 급등 속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무역업체들이 시장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율은 6월 말 현재 달러당 4300짜트(Kyat)까지 상승해 중앙은행(CBM·Central Bank of Myanmar)이 고시한 기준환율 달러당 2100짜트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또한 최근에는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대체 교역로로 주목했던 국경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Ethnic Armed Organizations), 시민방위군(PDF·People’s Defence Force) 등 반정부 세력과의 교전이 격화되며 무역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현지 교역 여건을 모니터링 중인 글로벌 조사기관과 국제기구들도 육상무역로 단절에 따른 교역실적 추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연이은 악재로 인한 미얀마의 무역 부진은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2023~2024회계연도의 전체 교역액은 301억1876만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의 339억7290달러 대비 11.3% 감소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024~2025회계연도 1개월 간(2024년 4월)의 교역 실적도 약 2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연간 교역이 이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의 올해의 예상 무역규모가 전년 대비 약 70%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경을 통한 4월 한 달 간의 수입은 8232만 달러로, 추세 상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8% 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경 지역의 교전이 육로 수입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대외무역의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정부도 교역 악화의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얀마 상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우선 조달하기 위해 최근 교역 관련 긴급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중 보세창고 우선 입고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무부 수출입 공지 '제2/2024호', '제3/2024호와 외환감독위원회(FESC·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물물교환식 교역 도입 공지(BTA·Barter Transaction Arrangement)’가 필수재 도입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순위 필수재의 임시 계류 허용
현지 상무부는 지난 5월 30일 보세창고에 입고할 수 있는 제품의 목록을 재공지하며, 창고 운영 원칙의 엄수와 예외품목에 대한 제한적 보관 허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하기에 표에 열거된 품목들은 원칙상 입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세창고에 넣고 계류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화물은 상무부가 강제하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여도 압수나 폐기 처리 없이 사후 승인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참고로 미얀마에서는 상무부가 수입 라이선스 심사 범위와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 2022년 4월 이후부터, 미승인 제품을 보세창고로 우선 반입해 계류시키며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는 편법 통관이 수입업체들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해 온 바 있다. 실제로 현지 정부에 의해 비필수 사치재로 분류되어 라이선스를 제때 받지 못한 화장품,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의 일반 소비재는 물론 산업용 원자재들의 상당수도 이와 같은 ‘선(先)계류 후(後)승인’ 방식을 통해 통관 허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실무적 한계를 고려해 보세창고 편법 입고를 묵인해왔던 미얀마 정부도 지난해 12월부터는 부적절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위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원칙 엄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상무부 행정공지 제16/2023호). 특히 보세창고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사후 수입승인 목적의 화물’이 무분별하게 입고되며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들이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번 공지에도 규정 위반 화물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재차 명시돼 있어, ‘수입 라이선스를 통한 수입 억제의 실효성 확보’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세창고 운영 원칙에 관한 최근의 공지가 수입제한 의지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에는 앞선 공지문에서 14개 항목으로 묘사된 ‘보세창고 예외 입고 허용 품목’들이 HS 코드까지 표기된 도표로 정리되어 명확하게 안내됐다. 즉 보세창고의 본래 운영 취지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국민 생활과 산업생산 유지에 필수적인 품목은 우선 반입시키겠다는 현지 정부의 실무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예외 입고 대상’ 제품은 의약품, 산업용 원자재, 화학제품 원료, 필수 식료품 등 상무부가 선순위 수입허가를 강조해 온 품목과 대부분 일치했다. 정책적으로 수입을 장려하고 있는 전기차 및 관련 부품류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통화 사용 배제한 ‘물물교환 교역’ 도입 움직임
한편 외환감독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5월 2일 물물교환식 무역(BTA)의 실시를 예고하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이는 국경게이트를 통한 육로 무역에서 미리 정한 품목에 한정해 외환거래 없이 제품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행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에 큐민시드(Cumin Seed), 살아있는 물소, 표백 분말제, 빈랑 견과류(Betal Nuts)를 넘겨주고 생강, 사문근(Serpentine Root), 강황 등을 받아오는 물물교환 거래를 실시했다. 2019년 2월에는 중국과 살아있는 물소와 소를 직접 BTA 방식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중국 원난성과의 거래를 전제로 건설자재, 농기계, 비료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7월에는 중국 쿤밍시에 쌀 100만 톤을 넘겨주고 기계와 생활용품을 받아오는 물물교환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BTA 거래 적용 대상은 과거에 비해 매우 넓은 편이다. 실제로 쌀, 쇄미(碎米), 콩, 옥수수, 깨, 커피 등의 농산물과 면직물, 해산물, 전통약재,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이 미얀마의 물물교환 수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비료, 농약, 산업용 원자재, 전기 자동차, 농기계, 연료, 팜유 등 현지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선순위 수입대상 필수재’ 대부분은 수입 대상으로 명시됐다. 즉, BTA 거래는 극심한 외환 부족을 겪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핵심 품목을 들여오기 위해 도입한 고육책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효성에 관한 현지업계의 반응
한편 현지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BTA 거래 제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The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지난 5월 28일 BTA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상세한 적용 범위와 거래 이행 방식이 무역업계 전반에 포괄적으로 안내되지는 않았다. 특히 외환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임에도 ‘수출대금 일부(35%)에 대한 강제 환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정확한 설명 없이 포함돼있는 등 안내문의 내용이 난해하다는 점도 현장의 비판을 유발하고 있다.
실무적 시행을 관장할 상무부의 관계자도 익명의 인터뷰에서 시행 기간, 실제 적용 범위 등의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을 수입해 유통 중인 현지업계 관계자는 "도로의 유실, 국경 지역의 정치적 불안 등 위험 요소가 산적해 있다"며 “육로 운송을 전제로 하는 BTA 거래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과거 쌀, 동물류 등 한두가지 품목에만 적용되던 물물교환식 교역이 현재 공지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제품군을 대상으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기구는 미얀마의 교역 여건 악화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었다. 특히 무역 규모의 전반적인 축소 속에 국경 지역을 통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며 현지 산업생산력 유지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재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21년 이후 계속된 외환 위기도 수입 역량 악화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세창고 운영 원칙의 예외 적용과 물물교환식 거래 도입 움직임 등은 극심한 필수재 공급난 속에 나온 현지 정부의 긴급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정책은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이와 같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즉, 6월까지 발표된 미얀마 정부의 대응책들은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외환 위기의 완화와 국경 지역의 정세 안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단기간내 현지 교역 환경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 외환감독위원회, KOTRA 양곤무역관 인터뷰 및 조사자료 종합